《장자》
오강남 풀이, 현암사 2014(1999 초판 29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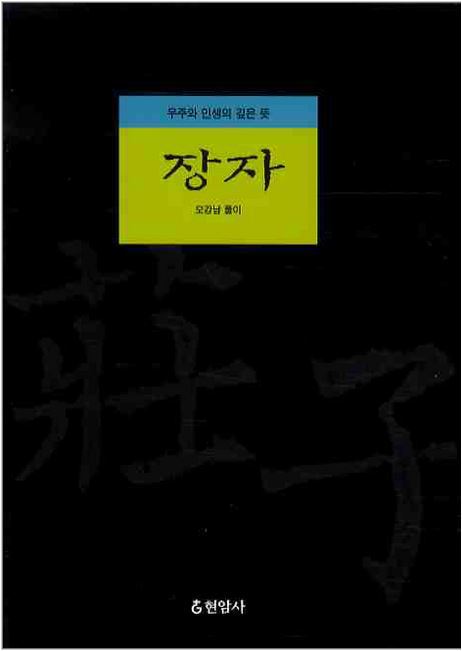
1
『장자』를 읽어봤습니다.
장자……, 내가 『장자』를 읽다니! 세상 참 좋아졌구나 싶습니다.
읍내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방학 때 친구네 아버지가 우리 집 사랑에 놀러와서 "넌 책 좀 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자'도 읽었겠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며 막무가내로 '덤벼들던' 때가 떠오릅니다.
오십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면 좋겠는데 그분도, 그분의 아들인 내 친구도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었습니다.
2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퉁소 소리
2. 자유(子遊)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감히 물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자기(子綦)가 대답했습니다. "땅덩어리가 뿜어내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것이 불지 않으면 별일 없이 고요하지만, 한번 불면 수많은 구멍에서 온갖 소리가 나지. 너도 그 윙윙 하는 소리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산의 숲이 심하게 움직이면, 큰 아름드리 나무의 구멍들, 더러는 코처럼, 더러는 입처럼, 더러는 귀처럼, 더러는 목이 긴 병처럼, 더러는 술잔처럼, 더러는 절구처럼, 더러는 깊은 웅덩이처럼, 더러는 좁은 웅덩이처럼 제각기 생긴 대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화살이 씽씽 나르는 소리, 나직이 꾸짓는 소리, 숨을 가늘게 들이키는 소리, 크게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깊은 데서 나오는 듯한 소리, 새가 재잘거리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내지. 앞에서 가볍게 우우 ― 하는 소리를 내면, 뒤따라서 무겁게 우우 ― 하는 소리를 내고, 산들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지.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면 그 모든 구멍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도 저 나무들이 휘청휘청 구부러지거나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겠지."
3. 자유가 말했습니다. "땅이 부는 퉁소 소리란 결국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군요.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는 대나무 퉁소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온갖 것에 바람을 모두 다르게 불어넣으니 제 특유한 소리를 내는 것이지. 모두 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건 누구겠느냐?(65~66)
3
쉽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장자』였다면 진작에 읽었을텐데…….
「여희의 후회」처럼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얘기, 「자유의 네 단계」처럼 제목은 좀 고약하지만 실제로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비의 꿈
32. 어느 날 장주(莊周)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 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物化)'라 한다.(134)
「나비의 꿈」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하! 바로 이 애기구나!' 싶었고, 「포정의 소 각뜨기(庖丁解牛)처럼 일찍 알았더라면 아는 체하기가 좋았겠다 싶은 얘기도 여러 편이어서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어 장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포정이라는 백정이 임금(文惠君) 앞에서 소 잡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 솜씨가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절묘한 것이어서 인위적 기교가 아니라 칼로 베지만 칼로 베는 것 같지 않게 베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도(道)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통째인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神)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 기관은 쉬고, 신(神)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틈바귀에 칼을 밀어 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靭帶)나 건(腱)을 베어 본 일이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5.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넓어,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서 갈려 나온 것 같은 것입니다.
6. 그렇지만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놀리면 뼈와 살이 툭 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갈무리를 합니다."(146~148)
그렇게 제1편 '자유롭게 노닐다(逍遙遊)', 제2편 '사물을 고르게 하다(齊物論)', 제3편 '생명을 북돋는 데 중요한 일들(養生主)', 제4편 '사람 사는 세상(人間世)', 제5편 '덕이 가득함의 표시(德充符)', 제6편 '큰 스승(大宗師)', 제7편 '황제와 임금의 자격(應帝王)', 부록 '외편·잡편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다 읽었습니다.
신나게 읽은 것입니다.
4
그런데 다 읽고 나니까 의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자를 읽었는데, 장자까지 읽었는데,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야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정신이나 마음에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꿈'은 정말로 장자에 나온다는 것,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대상도 거의 없게 되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포정의 소 각뜨기'가 좋겠다는 것, 겨우 그 정도?
'포정의 소 각뜨기'도 그렇겠지요? 그런 일화도 잘 써먹어야지 자칫하면 "구닥다리는 역시 어쩔 수 없어!" 하고 비웃음이나 사기 쉬울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읽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고 적어도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한문을 배워 정식으로 장자를 읽을 수는 없겠지? 이제 다른 책은 다 포기하고 한문만 배워도 안 되겠지? 번역본이라도 읽고 또 읽고 하면 될까?'
5
기원전 얘기들인데 그렇지도 않은 것도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같으면 밥이나 제대로 먹으며 살았겠나 싶어 했는데, 이를테면 '빈둥빈둥' '세월아 네월아' 하고 지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참주인(眞宰)'이라는 이야기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 사물을 대하여 서로 깎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달리는 말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고 마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잘된 것 보지 못하고, 그저 일에 쫓기고 지쳐 돌아가 쉴 데도 없으니, 이 어찌 애처롭지 않느냐? (…) (74)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에는 자동차나 PC가 나오지 않을 뿐 오늘날 우리의 일들과 뭐가 다른가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지나다가 또 생각나면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자. 번역본이지만 한 번 더 읽으면 그만큼 내 생각이나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0) | 2018.05.08 |
|---|---|
| 아름다운 한국, 한국의 봄 (0) | 2018.05.01 |
| 오츠 슈이치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0) | 2018.04.15 |
| 마저리 키넌 롤링스 《비밀의 강 The Secret River》 (0) | 2018.04.05 |
| 오츠 슈이치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조건》 (0) | 2018.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