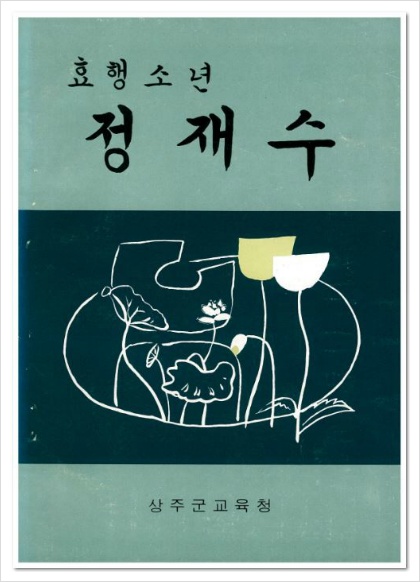
'효행' 같은 건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렵게 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그땐 그랬다는 얘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킨 '효행소년'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책을 지어낸 것입니다.
경상북도 상주군교육청에서 낸 장학자료였는데, 정재수라는 아이의 전기문이었습니다. 그 왜 설에 큰집에 차례 지내러 가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눈밭에서 얼어죽을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함께 죽었다는 그 아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효행소년 정재수』 축약판으로 보낸 자료가 반공소년 이승복 이야기와 함께 도덕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교과서를 한 권 보관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우리가 집필한 전기문 내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화니까 그렇다"고들 했습니다.
♬
『효행소년 정재수』는 동화작가 권태문 선생과 내가 나누어 썼습니다. 우리는 정재수 군이 태어나고 자란 집과 마을, 학교, 아버지와 함께 얼어죽은 그 산비탈을 찾아 살펴보며 이 전기문을 구상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태문 선생은 이미 등단한 아동문학가여서 표현, 구상 등 여러 면에서 나보다 고급이었는데도, 내가 고치면 고치는대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러자", "저러자" 하면 당장 집어치우고 "혼자 다 하라!"고 했을 텐데, 그분은 결코 그러질 않아서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모두 흐뭇해했고 교육장은은 특히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까칠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교육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걸핏하면 "교육장님이 부르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교육청 장학사들 옆에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해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공개를 마친 이튿날(그 공개 때 우리 반만 시범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7년 9월 16일, 아예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파견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교사는 교사지만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보니까 이 책의 교육장 머리말까지도 내가 썼습니다. 장학사들은 자신들 대신에 내가 글을 써주면 몇 군데 고쳐서 '명실공히' 자신의 글로 바꾸었지만 교육장은 그렇게 까칠한 성격인데도 매번 한군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모두들 나를 교육장 비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장도 동화작가 권태문 선생도 다 흘러간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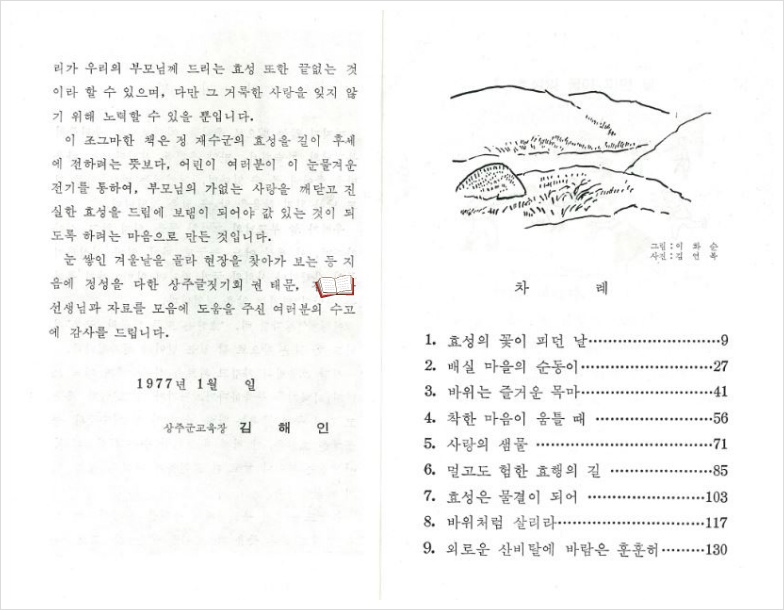
달포 전이었습니다. 저녁에 헬스장에 가서 그냥 두면 굳어버릴 것 같은 하체를 좀 움직이다가 아파트 안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데 보안등 아래에서 돌연 권태문 선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상주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일찌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교사 생활보다는 동화쓰기에 전념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글만 써서 생활을 꾸려가고 아들 셋 키우고……
내가 교육부 근무를 마쳤을 즈음이었던가, 참으로 오랜만에 박두순 시인을 만나서 권태문 선생 근황을 물었더니 생활이 어렵고 게다가 지병으로 거의 두문불출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박두순 시인은 아동문학 동호인이어서 연락은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박두순 시인을 만났을 때는 안되겠다 싶어서 권태문 선생에게 멋진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기도 했습니다.
♬
권태문 선생 생각을 하며 헬스장에서 돌아오던 그 며칠 후에 박두순 시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낸 시집을 한 권 보여주면서 권태문 선생은 결국 작고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런……'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참, 그 참" 하며 듣는 동안, 박 시인은 권태문 선생의 아들 셋 중 둘인가가 아버지보다 앞서갔다고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영혼이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보고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권태문 선생의 영혼이 그 저녁에 나를 찾아왔던 것이라면 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슴아픈 일을 겪은 셈입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들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하기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가 막혀서 하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
그분을 만나는 것도 나의 숙제였는데, 숙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그 숙제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변 인물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구체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부음을 듣는 사람이나 피차 어색하게 되는 건데, 매번, 자꾸, 이렇습니다.
이제 죽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구촌 어린이들이 본 세상』Ⅱ (0) | 2014.11.13 |
|---|---|
| 『지구촌 어린이들이 본 세상』 (0) | 2014.11.07 |
| 『明倫春秋』 창간호 (0) | 2014.07.22 |
| 내 이름이 처음으로 실린 책 (0) | 2014.07.09 |
| 김만곤 외 『세계를 배우는 어린이지도』(공저) (0) | 2010.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