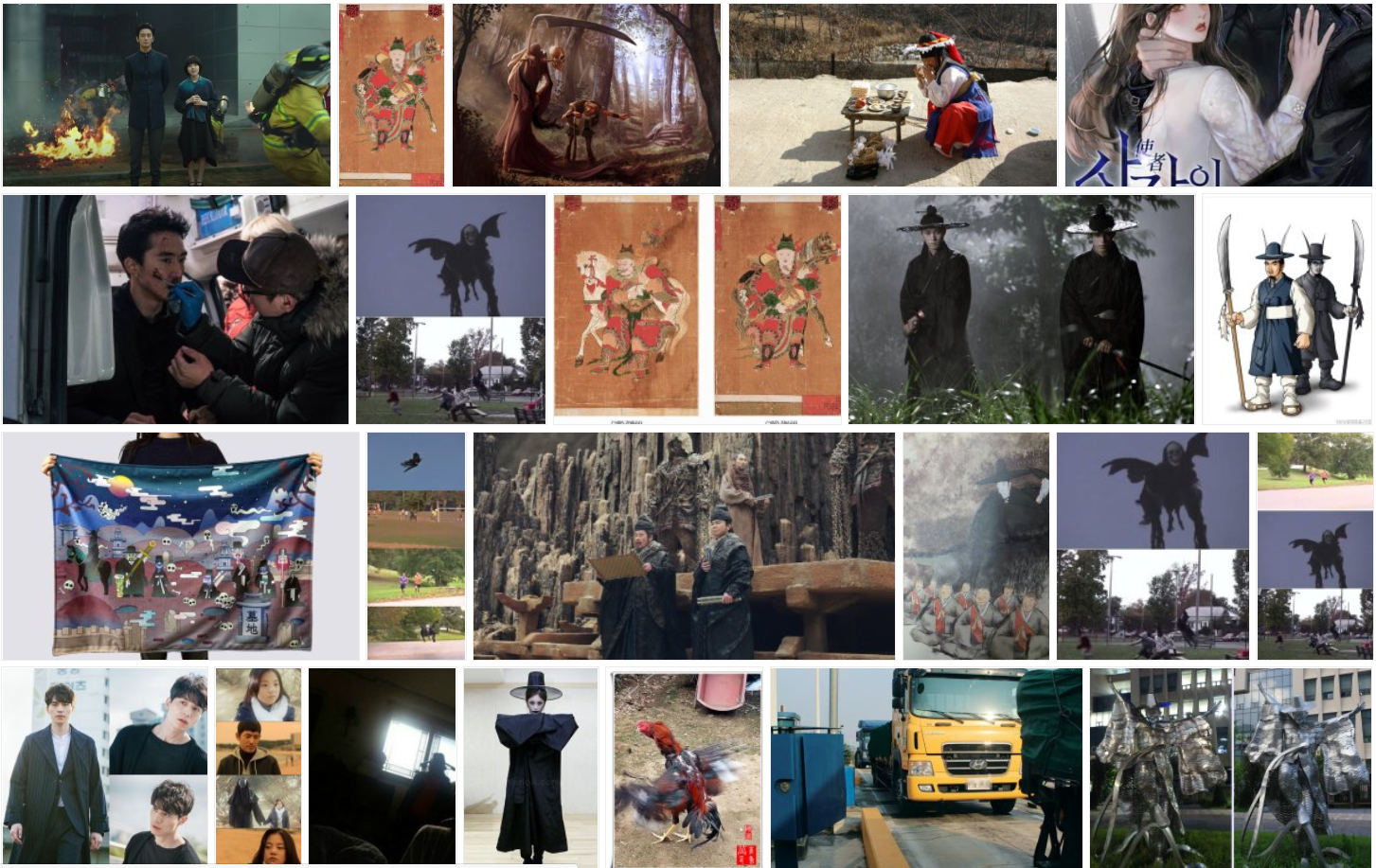
학교에 근무하니까 대체로 교장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겸연쩍게 노인 취급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새파란(?)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은 노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을이어서 그런가요? 10월이고 날씨조차 '가을맞고' 그러니까 '올해도 거의 다 갔구나' 싶어서 서글퍼집니다. 지난 3월(그러니까 저쪽 학교에 근무할 때), 이 블로그의 그 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의 주인공인 함수곤 교수께서 짤막한 글을 하나 달라고 해서 '알고 보면 우리와 친밀한 사이인 저승사자'란 글을 써주었는데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젊은이"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다 늙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세태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오늘은 '한밤의 사진 편지'(함수곤 교수가 몇몇 지인들에게 거의 매일 보내는 메일의 이름)를 사랑하는 모임의 운영위원 ○○○ 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 위원님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신 교육과정 전문가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사회과의 지역 교과서를 처음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도 개척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고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하며 책을 잘 만드는 편집 능력이 뛰어난 재주꾼입니다.
함수곤 드림
알고 보면 우리와 친밀한 사이인 저승사자
올해도 '어영부영' 두 달이나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오늘 3월 2일, 시업식과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는 멋진 시를 썼지만, 3월 초인데도 청승맞게 비가 내리니까 수소를 넣은 '희망의 풍선'이 저만큼 올라가다가 곧장 하강해 버려서 아이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혼이 날 일이고, "인생은 60부터"니 뭐니 하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초기 노인'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요즘은 건배를 해도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처럼 악착같이 청춘을 구가하고 싶어하고, 신문의 '건강 섹션'을 봐도 온통 "우리는 죽지 말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자!"는 투입니다. 인터넷에는 노년의 건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 꼭 해야 할 일 몇 가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TV를 보면 설움 받는 노년이 대부분인데 어쩌자고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순히 편한 마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주제넘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노년일기’나 써볼까 하고 몇 번인가 메모를 하다가 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도 모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과 같은 시(詩)도 발견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저승사자를 따라가게 될 텐데 내 길동무가 될 그는 누굴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와 더 친하게 지내놓으면 그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쓸수록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 시를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청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는 사람이다
윤제림(1959~ )
저승사자 따라가던 사람이 저승사자가 되어 옵니다. 회심곡(回心曲)에선 활대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온다고 그려지는 사람. 그러나 저승사자도 백인백색. 나같이 둔한 사람은 벼랑길 천리를 제 발로 기어옵니다. 산허리 하나를 도는 데도 한나절, 만고강산 부지하세월입니다. 날 듯이 걸으라는 황천보행법도 못다 익히고 허구렁길 밝히는 주문도 자꾸 잊어서 밤낮 헛발입니다. 죽은 사람 데리고 돌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저승사자가 병아리 귀신보다 허둥거리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 귀신은 귀신이어서 아득한 천지간을 수도 없이 자빠지고 구르다 보니 길 끝입니다.
문을 여니 구청 앞 버스 정류장. 여기서부터는 자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이 더 익숙합니다. 살던 동네니까요. 그래서 저승은 햇귀신한테만 심부름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살던 동네라도 오래 못 보면 남의 동네처럼 설어지니까요. 그래서 저승은 젊은 귀신들한테만 사자를 시키나 봅니다. 하긴, 저승사자가 지하철 1호선 2호선도 구분 못해서 엉뚱한 곳이나 헤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세월아 네월아 길이나 묻고 다니면 어디 저승 공작원 체면이 서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이 근방에 지금 막 죽었거나 금세 죽게 생긴 사람 없느냐 묻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승사자는 묻지 않고도 조등이 내걸린 골목을 대번에 찾아냅니다. 차일 아래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 끼여서도 누워 있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저승사자가 낯선 이름이 적힌 쪽지나 사진 같은 것을 들이밀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는 데려가야 할 사람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를 데려가는 사람이 누군인지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들은 때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누르느라 진땀을 뺍니다.
저승사자.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을 납치해가는 외국의 기관원이라 해도 좋고, 더 좋은 세상으로의 망명이나 밀입국을 꿈꾸는 사람을 돕는 정의의 사자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들은 철면피나 냉혈한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세상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아닐까요. 안심하십시오. 아, 그 사람과 함께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마음 푹 놓아도 좋을 사람이니까요. 저승사자는 면식범이니까요.
'詩 읽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승사자는 아는 사람이다 Ⅱ (0) | 2009.05.08 |
|---|---|
| 최문자 「부토투스 알티콜라」 (0) | 2009.05.02 |
| 박흥식 「절정」 (0) | 2009.04.01 |
| 김소월 역 「봄」 (0) | 2009.03.31 |
| 박인환 「목마와 숙녀」 (0) | 2008.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