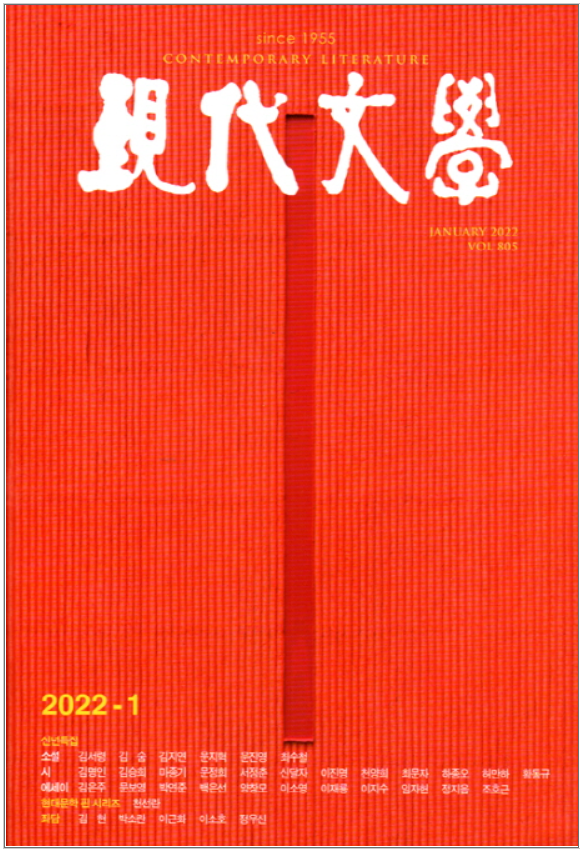
김숨 단편소설 《파도를 만지는 남자》(문장 발췌)
「현대문학」 2022년 1월호
* 흰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내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 가을 선생님, 혼자서 갈 수 있어요?
* 가을 선생님, 혼자서 잘 찾아가야 해요.
* "나도 너희와 같단다. 그래서 너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단다. 내게 너희 목소리를 들려주겠니?"
* "우리 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도록 하자."
* 열여덟 살 여름방학 전까지 보이던 버스 번호판이 안 보였어요. 나는 버스를 잘못 탈까봐 두려웠어요. (...) 내 눈이 멀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 나는 기다려요. 낯선 곳에 가면 그곳의 소리들이 내게 길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요. 세상의 소리들은 내게 길을 만들어줘요. 차들이 도로를 달려가는 소리, 상점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발소리,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음식점 환풍기 소리, 공사장에서 울리는 소리, 셔터 올리는 소리, 셔터 내리는 소리...... (...) 나는 기다려요. 나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 아, 새들도 눈이 멀까?
아, 새들도 눈이 멀어 태어나기도 할까?
* 바다는 점 네 개예요. 나는 바다라는 글자를 쓸 줄 알지만 쓰지 않을래요. 나는 바다라는 글자를 쓴 적 있어요. 내가 쓴 바다를 나는 볼 수 없었어요. 그 바다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쓴 바다는 내가 쓴 파도와 함께 있어요.
내가 쓴 달과 함께 있어요.
* "우리 같이 가자." 그날 이후로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걸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 가을 선생님, 저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화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슬픈 게 뭐예요?
...........................................................................
'가을' : 아이 이름. 시각장애아(전맹).
이 소설에는 별 스토리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다. 전에 본 소설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한 명》 같다. 실제로는 치열하고 가슴 아파서 말도 하기 싫지만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열을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도 하다. 지금 일상으로 보고 겪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이 세상 안에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사실은 내 세상도 그렇다. 나의 세상은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위안을 준다.
저 선생님의 세상, 그 인식은 내가 예전에 특수교육 공부를 할 때 체득한 것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그 인식이 가슴아프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저 선생님의 세상.
나의 세상.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이 해리슨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 (0) | 2022.03.05 |
|---|---|
| 『상실 수업』⑵ 편지쓰기(발췌) (0) | 2022.02.10 |
| 칼 세이건 《코스모스 COSMOS》 (0) | 2022.01.30 |
| 마쓰이에 마사시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0) | 2022.01.25 |
| 윌리엄 트레버 《밀회》 (0) | 2022.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