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강은 옮김, 창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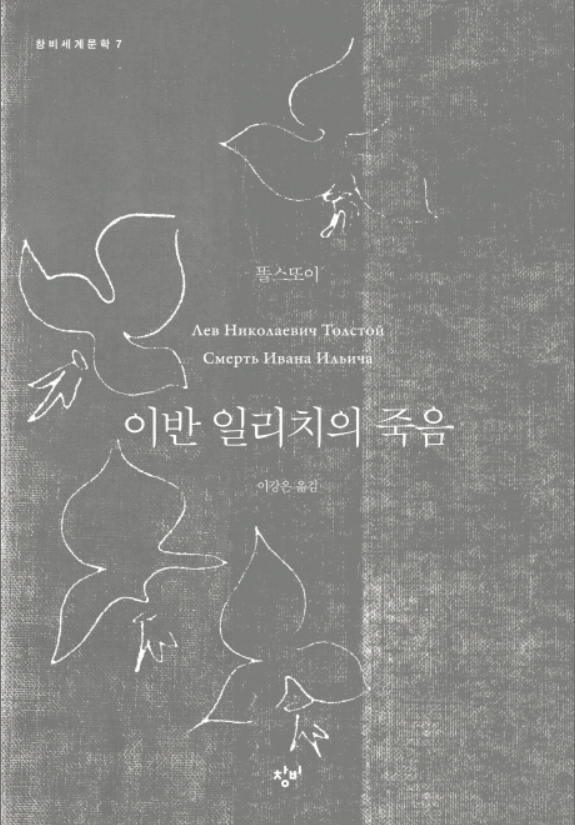
Ⅰ
이반 일리치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의 죽음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그에게는 참으로 난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Ⅱ
그는 판사입니다. 그런 그가 그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이 불분명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죽어가는 게 분명하다는 걸 느낀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과 삶의 의미를 곰곰이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키제베터1 논리학에서 배운 삼단논법을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이런 명백한 사실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되지 자신에게는 도무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카이사르는 인간이니까, 일반적인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 자신은 카이사르도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도 아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남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짜와 블로쟈, 장난감들, 마부와 유모와 까쩬까2,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온갖 환희와 슬픔,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바냐3, 특별한 바냐가 아니던가. 카이사르가 어떻게 어머니의 손에 나처럼 입 맞출 수 있을 것이며, 카이사르가 어떻게 어머니의 사각거리는 비단옷자락을 나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카이사르가 나처럼 법률학교에서 고기만두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카이사르가 나처럼 사랑에 빠질 수 없지 않은가. 도대체 카이사르가 나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카이사르는 인간이었고 따라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나 바냐, 이렇게 나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이반 일리치, 나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다.(71~72)
Ⅲ
그는 살아가는 일에 누구 못지않게 열의를 쏟았습니다. 시류에 민감하였고 출세에 집착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받을 짓을 하는 속물이 되지도 않았고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몹쓸 병에 걸렸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억울해하며 신과 운명을 저주합니다.
날이 갈수록 망가져 가는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 아내, 친지, 의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최소한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만이라도 인정하고 심각하게 여기라는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은 집어치워. 내가 죽어간다는 건 당신들이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제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83)
Ⅳ
그러던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빛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아내를 불쌍하게 여깁니다.(117)
'그래, 내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구나.'
'모두 참으로 안됐어. 하지만 내가 죽으면 훨씬 나을 거야.'
그는 아내에게 '용서해줘' '보내줘'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일순간 밖으로 쏟아져나가는 걸 느꼈고, 가족들이 모두 안쓰럽게 여겨져서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공포 대신 빛을 보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119)
Ⅴ
소설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절친했던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9)
'이제 시따벨이나 빈니꼬프의 자리는 틀림없이 나의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였어. 이번 승진으로 개인 집무실이 생기고 연봉도 800루불 이상 오르겠지.'(표도르 바실리예비치)
'이제 깔루가에 있는 처남을 이곳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넣어야겠군.' '아내가 아주 좋다고 하겠지. 앞으론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느니 어쩌지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뾰뜨르 이바노비치)
심지어 이바노비치가 마지못해 문상을 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카드놀이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등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장면은 방금 숨을 거둔 이반 일리치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리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
1. 요한 고트프리트 키제베터(Johann Gottfried Kiesewetter, 1766~1819). 독일의 철학자로 칸트의 제자.(이하 모두 책 속의 각주)
2. 미짜, 블로쟈, 까쩬까는 이반 일리치의 형제와 누이인 미하일, 블라지미르, 예까쩨리나의 애칭.
3. 바냐는 어릴 때 이반을 부르는 애칭.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엘렌 심 『Nancy the cat 고양이 낸시』 (0) | 2016.01.20 |
|---|---|
|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0) | 2016.01.13 |
| 마르시아스 심 『떨림』 (0) | 2016.01.08 |
| 루이저 린저 『생의 한가운데 Mitte Des Lebens』 (0) | 2016.01.06 |
| 조지 오웰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 (0) | 2015.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