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길(단편소설) 「풀업」
《현대문학》 2022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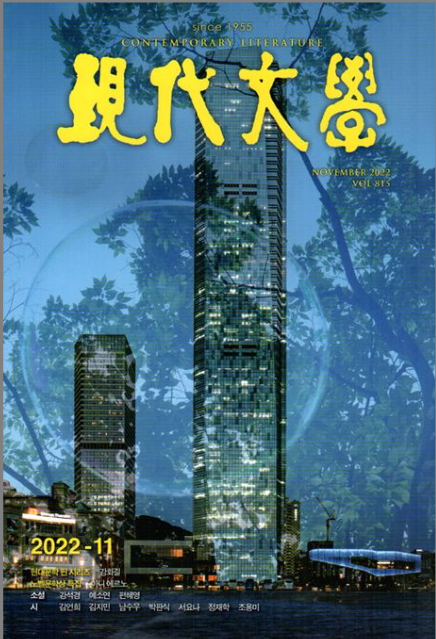
굳이 세월이라 할 것도 없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실감합니다.
사랑과 연대로만 이야기해야 옳던 가족 이데올로기조차 해체되고 엷어지고 있는 걸 모른 채(인정하기 싫은 채, 인정할 수가 없는 채) 살았습니다. 「풀업」이란 소설에서 두 군데를 옮겨 썼습니다.
"미수야."
그간 지수는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 때문인지 미수 역시 조금 당황한 듯했다.
"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계속 엄마 집에 얹혀살았으면 좋겠니? 아니면 독립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니?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래?"
"있잖아 미수야."
아주 오랫동안, 지수는 미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안 했다. 그랬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마음이 들었다. 지수는 입을 열었다.
"가끔은……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걸 보며 네가 안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 미수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팔짱을 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야."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를 의심했다. 미수가 지금 나를 '야'라고 부른 건가? 지수조차도, 지금껏 미수를 단 한 번도 '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나 바쁜 사람이야. 그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어. 언니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지수는 미수를 쳐다봤다. 팔짱을 끼고 자신의 언니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동생을 지수는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말했다.
"좀 되면 안 돼?"
"뭐라고?"
"나는 뭐든 좀 되면 안 되냐고. 왜 너는 항상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미수가 인상을 찡그렸다. 그러더니 거친 말투로 말했다.
"언니가 뭘 그렇게 못 했어? 재수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학원 보내줬잖아. 나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생활비 줬어. 나 대학원 가고 싶었던 거 알아? 나 그거 언니 때문에 포기한 거야. 언니가 집에서 빌빌대고 있으니까. 나라도 뭐든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했잖아. 일해서 엄마 생활비 드렸잖아. 그 돈을 엄마만 썼어? 언니 먹고 자고 입고……."
"그래서 엄마는 널 항상 햇볕에 내놨지."
"뭐라고?"
"너한테 잘해주셨다고. 그런데 맞아. 그렇게 해야지. 돈 버는 사람이 제일 대접 받아야지. 그게 우리 집 룰이었으니까. 그래서 나 그거 잘 지켰어. 너도 알지 않니?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어.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다는 소리 들어도 가만히 있고, 팔자에 운이 없는 것 같다는 소리 들어도 가만히 있고, 나 빼고 외식하러 가도 가만히 있고, 상황 파악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가만있었어. 언제나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궂은소리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 그치?"(219~220)
지수는 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미수를 자랑하는 걸 들었다.
"세상에 보리굴비가 그렇게 맛있더라니까. 내가 미수 아니면 그런데 언제 가보겠어."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웃었다. 어쩐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머니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일종의 기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기만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은가. 미수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지수는 기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미수와는 평생 이런 관계로 살아갈지도 몰랐다. 어릴 때 지수는 가족이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이다.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란 없다. 설사 그게 피붙이라 할지라도. 서로 볼꼴 못 볼꼴을 다 보며 함께 자란 사이라 해도 말이다. 어떤 면에서 지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홀히 해오지 않았던가. 그것 역시 일종의 이별이 아니었을까. 지수는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수는 당장은 이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222~223)
<《현대문학》 2022년 12월호 소유정의 리뷰에서>
* 지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이 희생하며 애써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이름과 관계의 유지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희생된 한쪽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 ...... 가족 내에서의 소외와 자기혐오를 극복하였듯 지금의 새로운 감각을 발판 삼아 자기 서사를 재구축할 수 있으리라. 자신의 힘으로 사라지는 주체성을, 그것을 표현할 언어를 되찾은 이의 도전은 더없이 아름답다.
지수와 미수의 이름, 구구한 사연은 백인백색이겠지만......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도 잊고 가는 길도 잃어버린 상중(湘中) (3) | 2023.06.18 |
|---|---|
| 페터 회 장편소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0) | 2023.06.12 |
| 이주혜(단편소설) 〈이소 중입니다〉 (6) | 2023.05.19 |
| 난감했던 낭독회(「엉망진창 학예회」) (8) | 2023.05.15 |
| 움베르토 에코(추리소설) 《장미의 이름》 (하) (0) | 2023.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