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한 파묵 《순수 박물관 2》
이난아 옮김, 민음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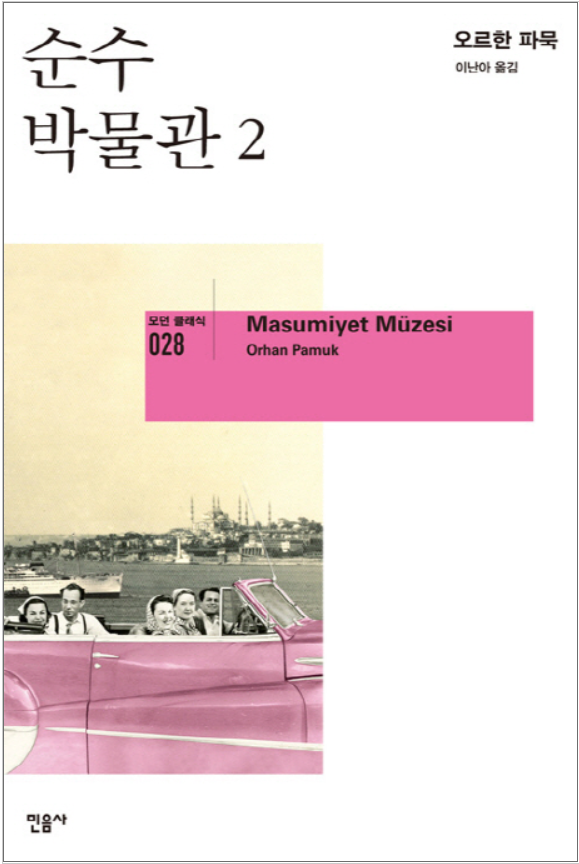
케말은 영화인 페리둔의 아내가 되어버린 유부녀 퓌순을 그리워하고 다가가고 싶은 욕망을 일일이 설명한다.
두려움, 초조함, 고통, 번민, 고뇌, 환희, 상심, 분노, 반성, 후회, 다짐, 상심, 슬픔, 희망, 기대……
사랑에 빠져서 헤어날 길 없는 마음의 변화를 낱낱이 보여준다.
무려 8년간!
일주일에 네 번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통금시간에 아슬아슬하게 그 집을 나선다.
정확히 칠 년하고도 열 달간, 퓌순을 만나러 저녁 식사 시간에 추쿠르주마로 갔다. 처음 간 것은 네시베 고모가 “저녁때 와요!”라고 말한 지 십일일 후인 1976년 10월 23일 토요일이고, 퓌순과 나와 네시베 고모가 추쿠르주마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것이 1984년 8월 26일 일요일이니, 그사이에 2864일이라는 날이 지나간 것이다. 이제 이야기할 이 409주 동안, 나의 메모에 의하면 그 집에 1593번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일주일에 평균 네 번 찾아간 것이다.(26)
방문 이유? 그게 참 가관이다. 퓌순을 만나러. 단지 바라보러.
케말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물론 나는 퓌순을 만나기 위해 갔다. 그리고 그들과 퓌순도 그것을 좋아한다고 여겼다. 퓌순과 그 가족이 내가 퓌순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사실을 대놓고 받아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른 이유를 찾아냈다. 나는 그곳에, 퓌순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호한 단어조차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덜 불편한 다른 단어를 본능적으로 선호했다. 나는 케스킨 씨네 집에 일주일에 네 번 저녁때 '같이 앉으려고' 갔던 것이다.(46~47)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나.
한심한, 어리석은, 멍청한, 어처구니없는, 병적인, 부끄러운("팔 년 동안 나의 상황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부끄러움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한 부끄러움에 시달렸다.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나 추쿠르주마에 있는 집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었다." 68), 별 수 없는, 비루한…….
사랑에 정말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은 별 수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든지!
그러면서 퓌순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조리 모은다.
그런 물건이 한두 가지인가?
케말은 심지어 퓌순이 등장하는 어떤 상황을 기억하고 싶으면 화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게 해서 보관한다.
케스킨 씨네 집 식탁에 앉아 있던 팔 년 동안, 나는 퓌순이 피운 4213개의 담배꽁초를 가져와서 모았다. 한쪽 끝이 퓌순의 장미꽃 같은 입술에 닿고, 입속으로 들어가고, 입술에 닿아 젖고(가끔 필터를 만져 보았다.) 입술에 바른 립스틱 때문에 붉은색으로 멋지게 물들어 있는 이 담배꽁초 하나하나는, 깊은 슬픔과 행복한 순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물건들이다. 퓌순은 구 년 동안 언제나 삼순 담배를 피웠다. 케스킨 씨네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 시작한 직후 나도 말보로 대신 퓌순처럼 삼순 담배를 피웠다. 나는 말보로 라이트를 골목 사이에 있는 밀수 담배 장수나 복권 장수에게서 사곤 했다. 어느 날 밤 말로보 라이트와 삼순이 포만감을 주는 담배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퓌순은 삼순이 기침을 많이 나게 한다고 했고, 나는 미국인들이 연초 안에 알 수 없는 독성과 화학 물질을 넣어 말보로를 아주 해롭게 만들었다고 했다.(199)
단추, 컵, 퓌순의 빗, 옛날 사진, 이렇게 열거할 필요도 없다. 퓌순의 모든 것, 퓌순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모았고, 퓌순의 집에서 훔쳐가지고 모았다.
그게 모여서 ‘순수 박물관’이 된다. 순수? '사랑'이라면 순수하지 않을 리 없다.
‘순수 박물관’을 염두에 두지 못한 사람은 그런 물건,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둘씩 흘리면서 살아간다면, 케말의 박물관 건립 계획은 철저하고 집요했다. 세상의 수천 박물관을 찾아다녔다.
달빛 아래, 물건들 하나하나는 빈 공간의 일부인 양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뉠 수 없는 분자처럼, 나뉠 수 없는 어떤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순간들로 이루어진 선이 시간이라고 했던 것처럼, 물건들이 모여 선을 이루면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375)
영화감독 페리둔과 이혼한 퓌순이 케말에 대한 '실망감'으로 세상을 버리고(케말 자신이 퓌순을 굶주린 늑대와 자칼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 자신은 그런 늑대 혹은 자칼과 무엇이 다른가?) 케말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제 그들의 이야기 ‘순수 박물관’만 남았다.
페리둔과 헤어진 퓌순이 케말에게 했던 말이 인상적이다. 잊히지 않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할게. 결혼 생활 내내 페리둔과 나 사이에는 부부 관계가 없었어. 이것을 꼭 믿어야 해! 그런 의미에서 난 순결해. 앞으로도 오로지 당신과 함께할 거야. 우리가 구 년 전에 함께했던 그 두 달(사실은 한 달 반에서 이틀이 모자랍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언급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나는 누군가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순결해."(292)
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고, 남녀 간이고, 사랑하는 사이다.
한심한, 어리석은, 멍청한, 어처구니없는, 병적인, 부끄러운, 비루한, 별 수 없는…….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존 브록만 엮음 《우리는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는가》 (0) | 2020.08.03 |
|---|---|
| 카를로 진즈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0) | 2020.07.19 |
| 오르한 파묵 《순수 박물관 1》 (0) | 2020.07.07 |
| 오르한 파묵 《다른 색들》Ⅲ 여기와 다른 곳 (0) | 2020.06.23 |
| 《다른 색들》Ⅱ 나는 왜 읽는가? (0) | 2020.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