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한 파묵 《순수 박물관 1》
이난아 옮김, 민음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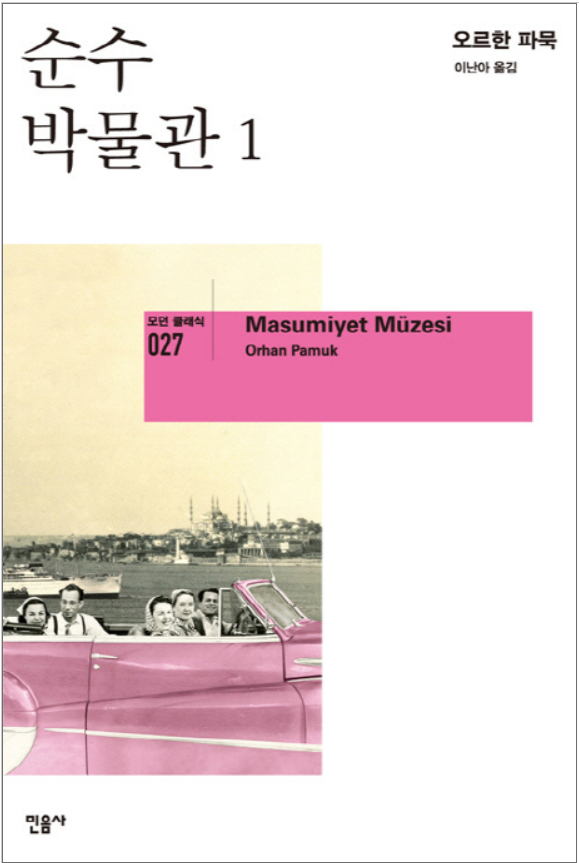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깊은 평온으로 내 온몸을 감쌌던 그 멋진 황금의 순간은 어쩌면 몇 초 정도 지속되었지만, 그 행복이 몇 시간처럼, 몇 년처럼 느껴졌다. 1975년 5월 26일 월요일, 3시 15분경의 한 순간은, 범죄나 죄악, 형벌, 후회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세상이 중력과 시간의 규칙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더위와 사랑의 행위로 땀에 흠뻑 젖은 퓌순의 어깨에 입을 맞추고, 등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간 후, 왼쪽 귀를 살짝 깨물었을 때, 귀에 걸린 귀걸이가 꽤 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가 저절로 떨어진 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서, 그 모양에 주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걸이 자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 계속 키스를 했다.(15)
(...)
퓌순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존재조차 거의 잊고 있던 열여덟 살의 가난한 먼 친척이었다. 나는 서른 살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와 잘 어울린다고 했던 시벨과 곧 약혼을 하고 결혼할 참이었다.(17)
부잣집 아들 케말은 아름답고 교양 있는 시벨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도 열여덟 살의 요정 퓌순과의 밀회도 즐기고 싶었다.
약혼식 다음 날 퓌순이 종적을 감추자 케말은 무너진다. 회사일에도 무성의해지고 마침내 멋진 약혼녀 시벨과도 헤어진다.
그렇지만 퓌순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집요하고 후회와 고뇌에는 그만큼 철저하다. 퓌순과 44일간 밀회를 즐긴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녀가 남긴 물건, 함께한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은다. 찻잔, 빗, 인형, 담배꽁초…… 당연히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을 무수한 기억과 그 편린들.
사랑의 이러한 기록은 처음 읽었다.
농담삼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때?" 상대편이 대답한다. "싫어! 그건 싫어! 그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감당하는 게 싫어! 너~무 힘들어."
이 소설을 읽으면 누구라도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 그럼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읽을 수는 있겠지?
―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다시…….
케말은 마침내 퓌순의 집을 찾아낸다. 그녀는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었다. (계속)
'책 보기의 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를로 진즈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0) | 2020.07.19 |
|---|---|
| 오르한 파묵 《순수 박물관 2》 (0) | 2020.07.08 |
| 오르한 파묵 《다른 색들》Ⅲ 여기와 다른 곳 (0) | 2020.06.23 |
| 《다른 색들》Ⅱ 나는 왜 읽는가? (0) | 2020.06.18 |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롤리타》 Ⅱ (0) | 2020.06.14 |



